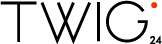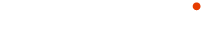檢 “대장동 같은 수사 불가능” vs 法 “최소 견제 장치” 압수수색 사전심문 갈등 격화
檢 “법원이 현장을 모르는 소리”
法 “과도한 압수수색 방지 차원”

법원, 검찰. 법률신문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최근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하려면 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법원은 전자정보가 저장된 매체뿐 아니라 정보의 종류(문자메시지, 통화 목록, 위치 정보 등)도 영장 발부 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특정 검색어만으로는 필요한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파일명 검색이 어려운 형태로 저장돼 있거나 파일 이름이 잘못 적힌 경우까지 고려하면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컴퓨터에서 찾아낸 ‘천화동인 1호 지분표’다. 정민용 변호사가 2021년 3월 29일 작성한 해당 지분표의 파일명은 ‘골프 잘치기’였다. 파일을 숨겨둘 목적으로 엉뚱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성착취물 수사를 해보면 초성으로만 파일을 저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오탈자로 기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다른 부장검사도 “영어 철자 한 글자만 달라져도 검색어가 다른 파일이 수백 개가 나온다”면서 “이러한 경우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증거 인멸, 수사 지연의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압수수색. 뉴스1
그 외에도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법관 대면 심리 수단 도입 ▲압수수색 집행 시 피의자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법원이 피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수사기관이 침해할 수 없도록 보루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의 밀행성’(비밀성)을 이유로 도입 불가를 외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법관이 피의자에게 입장을 물으면 수사 기밀이 유출된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규칙 개정이 아니라 아예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만일 관련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법원에서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진웅 기자
백민경 기자
박상연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